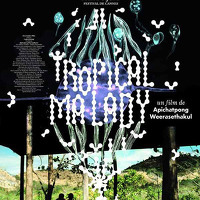경복궁역 근처 원서동에 있는 공간화랑 건물은 붉은 벽돌색 외장재가 멋들어진 곳이다. 이곳이 특이한 것은 내부벽도 붉은 벽돌로 마감돼 있다는 것. 넓지는 않지만 들어서는 순간 운치가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곳에 작품을 설치하는 건 흰 벽의 보통 갤러리보다 훨씬 더 까다롭지만, 성공할 경우 아우라도 더 상승한다. 이곳에는 중견 조각가들의 좋은 개인전들이 많이 개최된다. 올 봄에 열렸던 김기철의 <화양> 역시 그 중 하나다.

어둑하게 조명이 밝혀진 갤러리에 들어서면 단촐한 비주얼이 펼쳐진다. 정면 깊숙한 곳에 놓여 있는 둥근 원통, 그리고 벽에 걸린 두 개의 직육면체 상자 같은 것들. 나무색의 원통과 직육면체 상자 표면에는 작은 검은색의 사각형과 원형이 보인다. 하지만 그 외에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볼거리는 없다. 공간은 텅 비어 보인다. 하지만 이 공간에 실제로 들어가본 관객은 여기에 사진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빗소리이다. 작지만 성능좋은 스피커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빗소리는 정육면체와 원통형의 주변을 꽉 메운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전시실이 있는데 관객이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옆 전시실의 소리들까지 겹쳐저서 이제 소리는 공간 속에 입체적인 레이어를 만든다. 소리의 예술, 이른바 사운드 아트이다. 소리가 무슨 미술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는가. 현대미술이 이 영역 역시 자기 것으로 끌어당겨왔으니. 게다가 미술에서 다루는 소리는 음악에서의 소리와 다르다. 미술에서 소리는 어떤 식이건 공간성 혹은 물질성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와 미술은 일찍부터 관련을 맺어왔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라고 말하면서 음악적 요소들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칸딘스키 작품의 춤추는 듯한 리듬과 다양하게 변주되는 색채는 '음악의 상태'의 표현이다. 몬드리안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을 통해 흥겨운 재즈의 리듬을 크고 작은 네모칸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이런 작품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면, 직접 소리를 이용한 작품도 있다. 엄밀한 의미의 사운드아트는 이 경우를 가리킨다. 소리와 시각적인 것과의 이른바 공감각적 관계를 다루는 작업도 여기 속한다. 위에 소개한 <화양>에서는 그런 면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김기철은 예전에 소리를 눈에 보이는 음파로 변형하거나 드로잉이 소리가 되어 나오는 작품을 한 적이 있다.
소리와 시각적인 것의 상호번역 혹은 공존. '비주얼 뮤직'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경향의 작품은 오늘날 사운드아트의 주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 히라카와 노리미치(Hirakawa Norimich)의 <a circular structure for the internal observer>(2008)이나 미국 작가 신디 버나드(Cindy Bernard)의 작품 <projections+sound>(2005)이 여기에 속한다. 노리미치의 작품은 관객이 특정한 장소에 서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시각화되어 스크린에 투사되는 작품이다.
신디 버나드의 작품에서 관객은 스크린 앞에 앉아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각각의 곡의 이미지에 매치되는 색채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색채의 스크린만 등장하는 것이 작품의 포인트다. 특정한 형상이 등장하면 오히려 고정된 이미지에 의해 공감각적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사운드아트에서 시각적인 것은 종종 이렇게 최소한도로만 다루어진다. 앞에서 이야기한 김기철의 작품도 마찬가지.
하지만 작품이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이상 시각적인 것이 아예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다. 이 지점에서 작가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그냥 심심하니까 장식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꼭 필요한 요소로서 시각적인 것이 배치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니 나아가, 시각적인 것만이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걸까? 공간을 채우는 다른 수단은 없을까?
여기서 궁극의 사운드아트의 가능성이 나온다. 이 가능성이란, "소리는 청각적인 것만이 아니다"란 명제에서 나온다. 소리가 청각적인 것이 아니라니? 이상한 말 같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소리는 궁극적으로는 음파, 그러니까 물질적인 진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다.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 20kHz(킬로헤르츠)보다 주파수가 커서 '들리지 않는' 소리이다.
>

어둑하게 조명이 밝혀진 갤러리에 들어서면 단촐한 비주얼이 펼쳐진다. 정면 깊숙한 곳에 놓여 있는 둥근 원통, 그리고 벽에 걸린 두 개의 직육면체 상자 같은 것들. 나무색의 원통과 직육면체 상자 표면에는 작은 검은색의 사각형과 원형이 보인다. 하지만 그 외에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볼거리는 없다. 공간은 텅 비어 보인다. 하지만 이 공간에 실제로 들어가본 관객은 여기에 사진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빗소리이다. 작지만 성능좋은 스피커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빗소리는 정육면체와 원통형의 주변을 꽉 메운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전시실이 있는데 관객이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옆 전시실의 소리들까지 겹쳐저서 이제 소리는 공간 속에 입체적인 레이어를 만든다. 소리의 예술, 이른바 사운드 아트이다. 소리가 무슨 미술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는가. 현대미술이 이 영역 역시 자기 것으로 끌어당겨왔으니. 게다가 미술에서 다루는 소리는 음악에서의 소리와 다르다. 미술에서 소리는 어떤 식이건 공간성 혹은 물질성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와 미술은 일찍부터 관련을 맺어왔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라고 말하면서 음악적 요소들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칸딘스키 작품의 춤추는 듯한 리듬과 다양하게 변주되는 색채는 '음악의 상태'의 표현이다. 몬드리안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을 통해 흥겨운 재즈의 리듬을 크고 작은 네모칸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이런 작품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면, 직접 소리를 이용한 작품도 있다. 엄밀한 의미의 사운드아트는 이 경우를 가리킨다. 소리와 시각적인 것과의 이른바 공감각적 관계를 다루는 작업도 여기 속한다. 위에 소개한 <화양>에서는 그런 면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김기철은 예전에 소리를 눈에 보이는 음파로 변형하거나 드로잉이 소리가 되어 나오는 작품을 한 적이 있다.
소리와 시각적인 것의 상호번역 혹은 공존. '비주얼 뮤직'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경향의 작품은 오늘날 사운드아트의 주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 히라카와 노리미치(Hirakawa Norimich)의 <a circular structure for the internal observer>(2008)이나 미국 작가 신디 버나드(Cindy Bernard)의 작품 <projections+sound>(2005)이 여기에 속한다. 노리미치의 작품은 관객이 특정한 장소에 서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시각화되어 스크린에 투사되는 작품이다.
신디 버나드의 작품에서 관객은 스크린 앞에 앉아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각각의 곡의 이미지에 매치되는 색채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색채의 스크린만 등장하는 것이 작품의 포인트다. 특정한 형상이 등장하면 오히려 고정된 이미지에 의해 공감각적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사운드아트에서 시각적인 것은 종종 이렇게 최소한도로만 다루어진다. 앞에서 이야기한 김기철의 작품도 마찬가지.
하지만 작품이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이상 시각적인 것이 아예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다. 이 지점에서 작가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그냥 심심하니까 장식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꼭 필요한 요소로서 시각적인 것이 배치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니 나아가, 시각적인 것만이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걸까? 공간을 채우는 다른 수단은 없을까?
여기서 궁극의 사운드아트의 가능성이 나온다. 이 가능성이란, "소리는 청각적인 것만이 아니다"란 명제에서 나온다. 소리가 청각적인 것이 아니라니? 이상한 말 같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소리는 궁극적으로는 음파, 그러니까 물질적인 진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있다.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 20kHz(킬로헤르츠)보다 주파수가 커서 '들리지 않는' 소리이다.
소리가 그 자체로 물질적인 것이라면, 사운드아트를 전시장에 설치하기 위해 구태여 시각적인 것을 함께 배치할 필요가 없다. 김기철의 <화양>에서 빈 공간을 채우는 빗소리는 그런 종류의 사운드아트이다. 여기서 관건은 소리가 얼마나 정말로 물질적으로 감각에 작용할 수 있는가이다. 소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파동적인 성격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운드 아트는 종종 노이즈 아트(Noise art)의 형태로 나타난다. 작년에 내한한 즈비그뉴 칼콥스키(Zbigniew Karkowski)의 작업도 그 중 하나다. 노이즈 아트는 사운드 아트의 일종으로(때로 노이즈 아티스트는 자신들의 작업이 사운드아트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말 그대로 '소음'을 다루는 분야이다. 그런데 이 소음의 극단은 더 이상 청각적인 것이 아니다.
작년, 칼콥스키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Number Crunching>을 공연했을때, 장내를 가득 메운 관객의 삼분의 일 정도가 시작한지 1분도 채 안돼서 도망나온 사건(?)이 있었다. 대형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소음이 거의 물리적 고문의 수준으로 귀를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필자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귀를 막아가며 겨우 참고 있었는데, 앉아있는 동안 바닥과 벽이 계속 떨려서 그 진동이 몸에 전해져 왔다. 힘든 시간(!)이 끝나고보니 방 안의 유리 파티션 일부가 깨져 있었다. 여기서 소리는 청각적인 영역을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넘어선다. 소리는 신체에 와 닿고 신체를 압박한다.
그런데 공간을 채우는 물질적인 소리라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 21세기의 발명품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에 독일의 아방가르드 작곡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은 공연장 여기 저기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관객들에게 '방향과 움직임이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자 했다. <소년의 노래>가 그것이다. 원래 슈톡하우젠은 다섯 대의 스피커를 천정에도 매다는 등 다양하게 배치할 생각이었지만 초연때 기술적인 문제로 무대 주변에 늘어놓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한다.
<소년의 노래>는 실황 공연으로만 온전히 감상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파일 같은 걸로는 절대 뉘앙스를 느낄 수가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투브 링크를..) 이것이 이 곡이 음악이면서도 음악이 아닌 이유이다.
이 곡은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인데, 여기서 소년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자음과 혼합된 채 조각 조각 해체되어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독일어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해체돼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말은 흩어지고 모이는 입자들처럼 공중으로 분해된다. 사운드아트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소리, 인간의 언어 역시 물질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질로서의 소리가 차 있는 빈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미술이 공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런 종류의 사운드 아트는 종종 노이즈 아트(Noise art)의 형태로 나타난다. 작년에 내한한 즈비그뉴 칼콥스키(Zbigniew Karkowski)의 작업도 그 중 하나다. 노이즈 아트는 사운드 아트의 일종으로(때로 노이즈 아티스트는 자신들의 작업이 사운드아트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말 그대로 '소음'을 다루는 분야이다. 그런데 이 소음의 극단은 더 이상 청각적인 것이 아니다.
작년, 칼콥스키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Number Crunching>을 공연했을때, 장내를 가득 메운 관객의 삼분의 일 정도가 시작한지 1분도 채 안돼서 도망나온 사건(?)이 있었다. 대형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소음이 거의 물리적 고문의 수준으로 귀를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필자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귀를 막아가며 겨우 참고 있었는데, 앉아있는 동안 바닥과 벽이 계속 떨려서 그 진동이 몸에 전해져 왔다. 힘든 시간(!)이 끝나고보니 방 안의 유리 파티션 일부가 깨져 있었다. 여기서 소리는 청각적인 영역을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넘어선다. 소리는 신체에 와 닿고 신체를 압박한다.
그런데 공간을 채우는 물질적인 소리라는 이 아이디어는 사실 21세기의 발명품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에 독일의 아방가르드 작곡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은 공연장 여기 저기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관객들에게 '방향과 움직임이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자 했다. <소년의 노래>가 그것이다. 원래 슈톡하우젠은 다섯 대의 스피커를 천정에도 매다는 등 다양하게 배치할 생각이었지만 초연때 기술적인 문제로 무대 주변에 늘어놓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한다.
<소년의 노래>는 실황 공연으로만 온전히 감상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파일 같은 걸로는 절대 뉘앙스를 느낄 수가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투브 링크를..) 이것이 이 곡이 음악이면서도 음악이 아닌 이유이다.
이 곡은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성가곡인데, 여기서 소년들이 부르는 노래는 전자음과 혼합된 채 조각 조각 해체되어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독일어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해체돼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말은 흩어지고 모이는 입자들처럼 공중으로 분해된다. 사운드아트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소리, 인간의 언어 역시 물질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질로서의 소리가 차 있는 빈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미술이 공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지난 칼럼===== > 조선령의 NO Limit: 현대미술과 극단의 실험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리듬, 혹은 보이는 것 사이의 틈 (0) | 2010.12.04 |
|---|---|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0) | 2010.11.17 |
| 어떻게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 되는가 (0) | 2010.11.11 |
| 백남준이 바이올린을 부순 까닭은? (0) | 2010.10.20 |
| no limit - prologue (1) | 2010.10.12 |